확실함을 원한다면 <이상한 나라의 수학자>
고등학교 때는 자기 전에 돌린 롤 랭크 게임에서 지면 잠을 잘 수 없었다. 요즘은 자기 전에 푸는 백준에서 AC를 받지 못하면 잠을 잘 수 없다. 롤은 100% 승부욕 때문이고, 백준은 50% 승부욕 때문이다. 백준에서 나머지 절반의 이유는, 지금 풀지 못한 문제가 나의 무능력함을 드러내고, 내가 개발자가 될 지의 여부에 깃든 불확실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.
그래도 머리가 도통 돌아가지 않을 때는 빠르게 놓아주는 편이다. 그게 어제였고, 나는 '오늘은 안 되겠다' 하고 누웠는데, 잠에 들기 못내 아쉬웠다. 그래서 이 영화를 봤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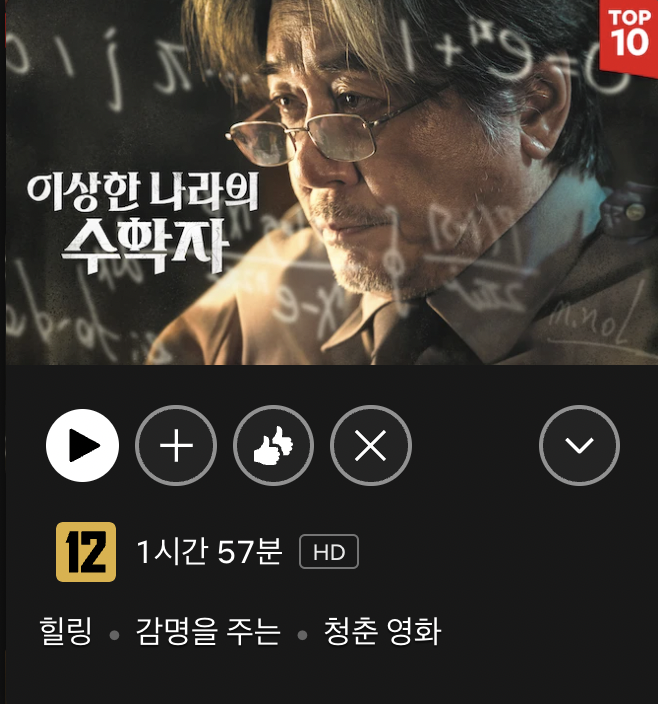
# 인상 깊은 대화
스승: 기냥 공식 한 줄 달랑 외워서 풀어버리면 절대 친해질 수가 없는 거야. 살을 부대끼면서 친해져야 이해가 되고, 이해를 하면 사랑할 수 있는 거야.
제자: 그렇다고 일일이 다 계산을 해요?
스승: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야. 생각. 공들여서 천천히. 아주 꼼꼼하게 생각을 하라는 거지.
내가 수능 과목 중에 수학을 가장 좋아했던 이유다. 단순히 수학에 가장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,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확실함 때문이었다. 그 확실함은 내가 사용하는 공식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고, 내가 접근하는 방식의 논리를 따져볼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. 반면 깊이 있는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던 국어나 영어를 풀 때 반쯤은 로또 번호를 찍는 기분이었다.
그래서 나는 같은 깨달음을 내 멘티에게도 전해주려고 하는 편이다. 한 번은 멘티가 근의 공식을 외우지 못하고 있길래, 나는 말했다. "근의 공식을 외우는 것도 좋은데, 유도할 줄 알면 까먹어도 괜찮다." 그렇게 같이 근의 공식을 유도했었다. 다음 만남 때 멘티는 '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법'을 전교 1등도 모르고 있더라며, 내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했다. "우리 학교 1등도 이거 처음 본다는데,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?" 나는 답했다. "그러면 네가 나중에 걔보다 더 잘할 수 있겠네."
그런데 PS를 할 때면 수학을 공부하며 얻은 깨달음과 거리를 두게 되는 것 같다. 수학자들이 발명한 알고리즘을 얼마나 깊이 이해해야 할까? 내가 수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, 그게 언제 쓰이는지, 그리고 어떻게 구현할지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나? 하지만 사용처와 구현 방법만 아는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머릿속엔 불안함 한 가득이다. 응용할 엄두도 안 난다. 나는 PS나 개발을 할 때 국어나 영어가 아니라, 수학 문제를 푸는 기분이었으면 좋겠다. 그러려면 역시 새로 배우는 지식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게 좋겠다.
스승: 이보라. 수학을 잘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네?
제자: 머리겠죠, 뭐.
스승: 머리 좋은 아새끼들이 제일 먼저 포기한다.
제자: 그럼 설마 '노력' 이런 거 아니죠?
스승: 그 다음번으로 나자빠지는 놈들이 노력만 하는 놈들이야.
제자: 그럼 뭔데요?
스승: 용기.
제자: 아, 뭐.
'아자, 할 수 있다.'
뭐, 이런 거요?
스승: 고거는 객기고. 문제가 안 풀릴 때는 화를 내거나 포기하는 대신에
'이야, 이거이 문제가 참 어렵구나, 야.'
'내일 아침에 다시 한 번 풀어 봐야 갔구나' 하는 여유로운 마음. 그거이 수학적 용기다. 기렇게 담담하니 꿋꿋하게 하는 놈들이 결국에는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거야.
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이다.
오늘 할 공부는 내일로 미루지 말되,
안 풀리는 문제는 내일로 미루자.